한국 고고학 백년을 쏟아부은 '팔수록 더 깊어지는 발굴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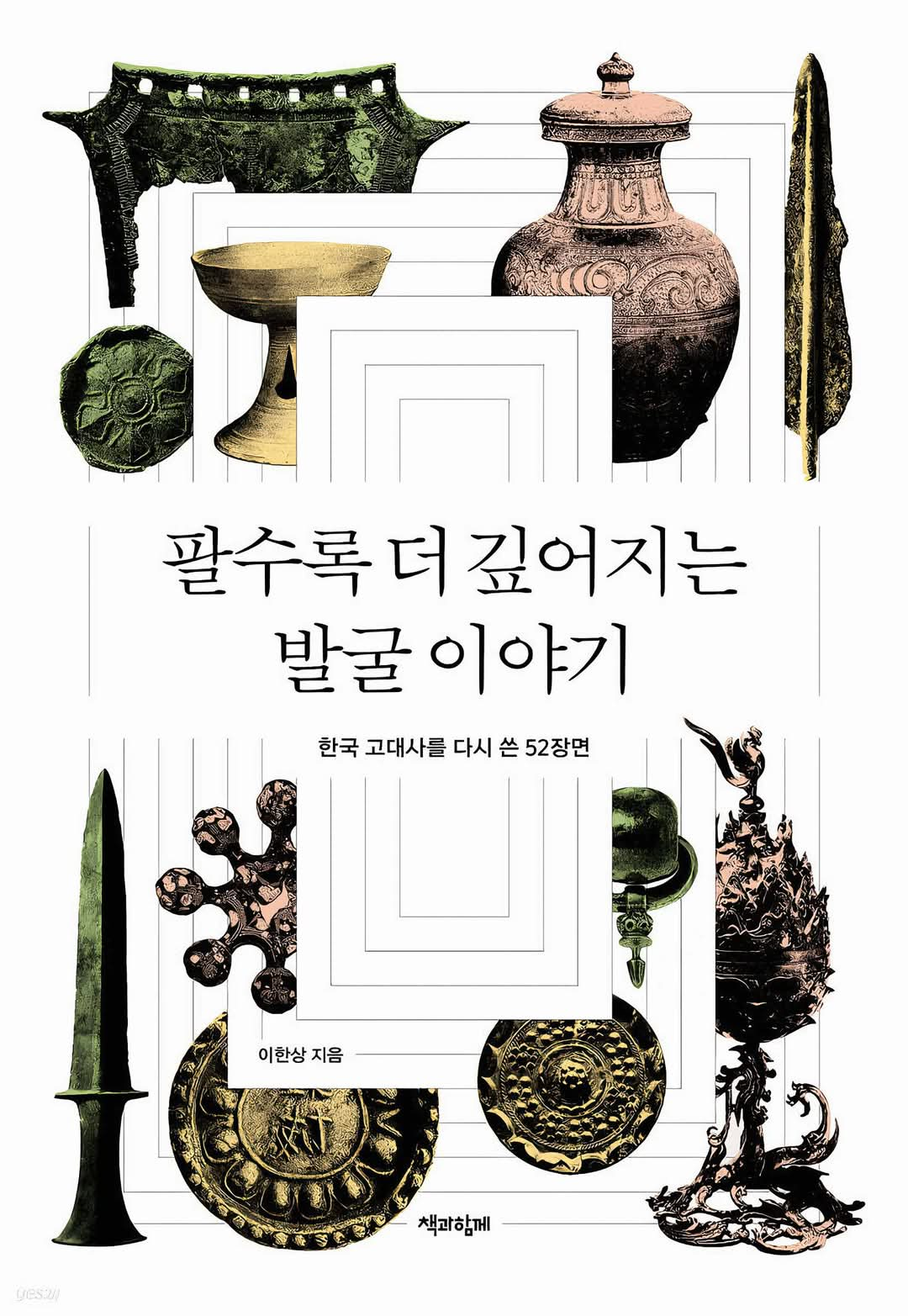
어떤 일을 부탁했을 적에 단 한 번도 그 부탁을 거절하는 일을 나는 못봤다.
나 같은 기자가 한둘이 아니었을 터인데, 내가 듣기로 모든 기자한테 이랬으니, 참으로 부단히 기자들이 써먹는 대표 고고학도가 바로 저자다.
흔히 이런 이를 일러 언론친화형 연구자라 하는데, 그 말에는 비난 조 색채가 들어가기 마련이다.
기자가 좋아하는 말만 한다는 그런 비아냥 말이다.
기자들을 일러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왜 연구자를 향해 그런 이런저런 말이 없겠는가?
기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 연구자, 기자들이 모를 것 같아도 옥석 구분 다 한다.
기자들이 가장 자주 찾으면서도 어느 기자도 기자들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 해서 결코 비아냥을 할 수 없는 천상 연구자 중 한 명이 바로 '팔수록 더 깊어지는 발굴 이야기'(책과함께) 저자 이한상 대전대 역사학과 교수다.
그의 이른바 주된 전공이 금속공예, 것도 고고학 기반인 까닭에 이런 유물이 나왔다 하면 기자들은 위선 선생을 찾는다.
본래 그 분야 전문가는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알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언터처블한 세계를 구축한다.
기자들이 물어보는 이런 사항들, 곧 어디서 뭐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정보가 그라 해서 다 사전에 들어갔겠는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모든 관련 정보는 그에게로 모였다 그에게서 퍼져 나가니, 철옹하는 난공불락 금속공예 이한상 제국은 이렇게 형성된다.

그가 제공하는 정보는 요긴하기 짝이 없다.
예컨대 어디서 금동신발이 나왔다 하면, 조금만 기다리라 하고선 조금 있다 날아드는 정보를 보면 기간 출토한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은 물론이고 지도까지 첨부되어 있으니,
내가 이럴 때마다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 새로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증보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저런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제는 꽤나 일반에도 이름을 알린 그가 마침내 국내 굴지하는 언론사 고정 코너를 맡아 연재도 하게 되었으니,
물론 내가 그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었고, 눈에 띨 때마다 탐독 정독했으니,
서문에 보니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두 군데서 연재한 모양이라, 실은 그 연재물을 읽을 때는 매체가 어딘지 나는 주시하지는 못했다.
저 두 신문에 끌려 들어간 까닭이야 보나마나 뻔해서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 한 몫 했으리라 본다.
덧붙여 이 참에 이런 걸 내 손으로 정리해 보자 하는 욕심도 없지 않았으리라.
저런 연재는 보통 기한을 정하지는 않는데, 두 신문에서 물경 8년이나 연재를 했다 하니, 이것이 무엇을 말함인가?
두 신문에서도 장사가 된다 생각했으니 그리하지 않았겠는가?
신문은 철저한 장사다.
그가 누구이건 장사 되지 않음 내일이라도 짤라 버린다.
'한국 고대사를 다시 쓴 52장면'이라는 부제를 장착한 이번 책은 부제 그대로 한국 고고학 발굴 혹은 발견에서 중대한 고비 혹은 국면을 초래했다 할 수 있는 52가지 사건을 추려 그것을 하나씩 왜 그것이 사건인지를 해설한다.
동삼동 조개무지 발견 발굴을 필두로 종횡무진 달려서 창녕 교동 비화가야 시대 무덤 발굴 이야기로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 고고학 백년이 오롯하다. 이제 한국고고학사 백년 이야기도 판본을 바꾸어 나올 날이 머지 않았다고 본다.
연재 당시에는 아마 이 순서를 지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 재배열 과정에서 해당 유적을 시대별로 짤라서 선사시대와 삼한,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로 농갔다.
백제 신라 비중이 아무래도 이쪽 발굴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무엇보다 저자 본인의 전공과도 밀접하기 때문이리라.
무령왕릉 발견 발굴은 참여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오래도록 그 전문박물관인 국립공주박물관에 봉직한 까닭에 더욱 애정을 쏟았으며, 공주 공산성은 시절 본인이 직접 발굴한 현장이다.
나아가 금동신발로 유명한 현장들은 그 자신 설혹 직접 발굴은 하지 않았다 해도 그 분석에는 죄다 참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런 현장은 더한 열정을 쏟은 흔적이 녹록하다.
이 책을 출간한 직후 선생이 연락을 하면서 느닷없이 이르기를 "이 책을 쓰면서 새삼 기자님 생각을 많이 했다. 서문 쓰면서 그 생각을 특히 많이 했다"하기에 내심 아 정리한다고 고생하셨구나 했는데,
그 서문에 느닷없이 내 이름이 오를 장면을 보고선 그 말 뜻을 비로소 조금은 이해했다.
생평 논문을 쓰는 일을 본령으로 삼는 전업적 연구자가 이와 같은 대중성을 장착해야 하는 책을, 더구나 그 원고는 신문 연재물이라, 그런 연재물을 쓰는 일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사실은 내가 비교적 잘 아는 편이다.
그런 일을 마다 않고 덜커덩 맡아서는 8년을 고생했으니, 이런 일로 생평을 보낸 나 같은 놈이 왜 생각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연재는 논문 쓰기랑 달라 무엇보다 대중을 사로잡아야 하며, 또 단순히 참고문헌 많이 뒤진다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나아가 그와는 별개하는 끊임없은 취재를 동반한다.
내가 굳이 전업적 연구와 저널리즘 영역을 가를 생각은 없지만, 이는 실은 굳이 따진다면 저널리즘 영역이다.
그 길을 개척하며 모지게 고생했을 선생께 고생하셨다는 의례적인 말만 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기 짝이 없다.
그가 채취한 이 발굴 이야기들은 그 하나하나가 실은 이런 단행본 한 권으로도 모자란 소재들이다.
저에서 논급한 서너 사례는 내가 따로 단행본화하기도 했지마는, 살피니 새삼스레 내가 앞으로 파고 들어어야 하는 소재들을 무궁무진하게 던져주어 한편으로는 고맙기 짝이 없다.
왜? 저걸로 나도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겠거니 해서 말이다.
하도 혹사당하는 바람에, 또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못해 고생한다는 말도 들리는데, 이런 성과들을 부디부디 앞으로 주구장창, 바퀴벌레 새끼치듯 그렇게 남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