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누군가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했다.
“교수님. 저는 평소에 교수님 글을 좋아하거든요. 교수님처럼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두의 눈이 반짝반짝해졌다.
그랬더니 교수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글 쓰는 것은 타고 나는 거야.”라고.
나중에 서양 미술사를 전공하는 동기에게 이 에피소드를 말해줬더니, 그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다른 교수님께 들었다 했다.
나는 두 교수님의 글을 좋아했다. 한 분은 수필 같이 따뜻하게, 다른 한 분은 냉철한 분석으로 차갑게 글을 쓰셨다. 두 분들만의 글쓰기 스타일은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분들만의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도 질문을 하면 무언가 글쓰기의 비법 같은 것을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저렇게 솔직한 고백이라니! 글쓰기도 안 되면, 내가 타고난 장점은 뭘까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
퇴사 전까지 계속 글을 써야하는 학예사들
학예사에게 글이란 계속 따라다니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전시를 할 때도, 교육을 할 때도, 다른 업무를 할 때도 글은 기본이다.
그 글이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 글이 A4의 반도 채워지지 않는 짧은 글일지라도, 업무의 상당량은 글로 채워진다.
글쓰기를 고민한 내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글을 쓰다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학예사는 연구를 하고 전시를 하는 직업 정도로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학예사는 유물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인 것 같다. 연구나 전시는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한 단계나 또는 방법일 뿐이었다.
전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제일 쉽고 많이 쓰이는 것은 글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글쓰기는 자신 없지만, 계속해서 업무를 위해 글을 쓰고 있다.
부담스러운 업무용 글쓰기
그런데 그 업무용 글쓰기를 잘 하고 있냐 하면, 그것도 자신이 없다. 가끔은 자원의 낭비가 환경오염과 공해를 일으키는 것처럼, 나의 글도 글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하는 엉뚱한 상상을 해본 적도 있다.
죽어서 지옥이 있다면, 내 글이 적힌 종이를 꾸역꾸역 먹어야 할 것 같은 망상을 해보기도 한다.
업무용 글쓰기는 블로그나 전자문서로 기록되는 것처럼 어느 가상의 공간에 담기지 않고, 전시의 패널로도 출판물로도 담겨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업무용 글쓰기는 늘 부담스럽다.
한때는 업무용 글쓰기는 사실에 입각한 드라이한 글을 쓰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마 ‘내 글’이 아니라, ‘박물관의 글’ 내지는 ‘공적인 글’이라 여겼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써도 ‘○○박물관’에서 열리는 전시에 실리는 글이 되기 때문에, 이 말도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글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했다.
내가 재미가 없는데, 관람객도 재미가 없지 않을까?
전시장을 지나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전시장에서 한줄 한줄 글을 읽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 특히 우리 박물관 같은 곳은 다른 박물관에 비해 글이 많아, 글을 다 읽으려면 1~2시간은 훌쩍 넘길지도 모른다.
나조차도 우리 박물관 전시를 다 읽어보려는 시도를 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 글을 읽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전시 패널의 제목은 가능한 임팩트 있게 써보려 노력한다.
제목을 보고 재미있을 것 같으면, 잠시 멈춰 서게 되니까. 바로 그 순간을 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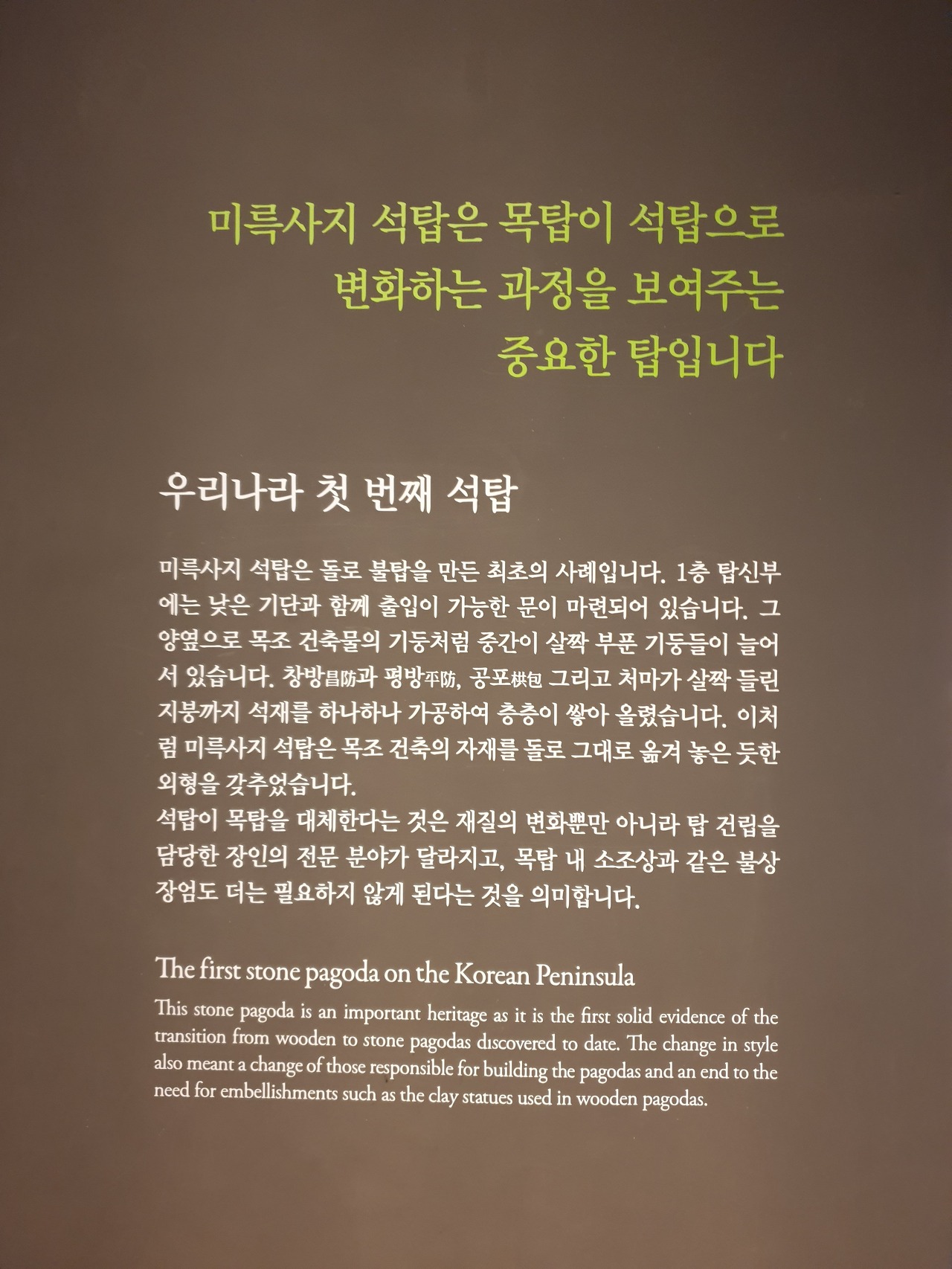
개인적으로는 패널 글을 경어로 쓰는 것을 선호한다. 무언가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점도 있긴 하다. 전시장의 글은 글자 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전시 패널은 300~500자의 글 안에서 이것만큼은 알아주었으면 하는 정보를 담아야 한다.
경어를 포기하면, 조금이라도 더 내용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 글쓰기에서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다.
첫 문장을 쓰는 것도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최근 선호한 글 시작 방법은 기사의 문장을 인용하거나 구체적인 날짜 등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마치 그때 일을 생생히 전달해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 종종 쓰곤 하는 방법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기 쉽도록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넣는 것도 내 글의 스타일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관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는 지적을 몇 번 들어서, 조금은 자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관람객을 사로잡는 글쓰기의 방법은 늘 고민이다. 그간의 글들이 성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관람객과 1:1로 이야기해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언젠가 ‘글이 재밌었어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매우 기쁘게 그 날을 보낼 것 같다.
'J의 특별하지 않은 박물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 구술 인터뷰 (1) | 2023.07.22 |
|---|---|
| 전시 크레딧의 의미 (0) | 2023.07.15 |
| 전시 스토리 :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까 (2) | 2023.07.01 |
| [전시가 만든 인연] (2) 옷소매 붉은 끝동 덕임과의 만남 (2) | 2023.06.12 |
| [전시가 만든 인연] (1)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기증하께요" (0)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