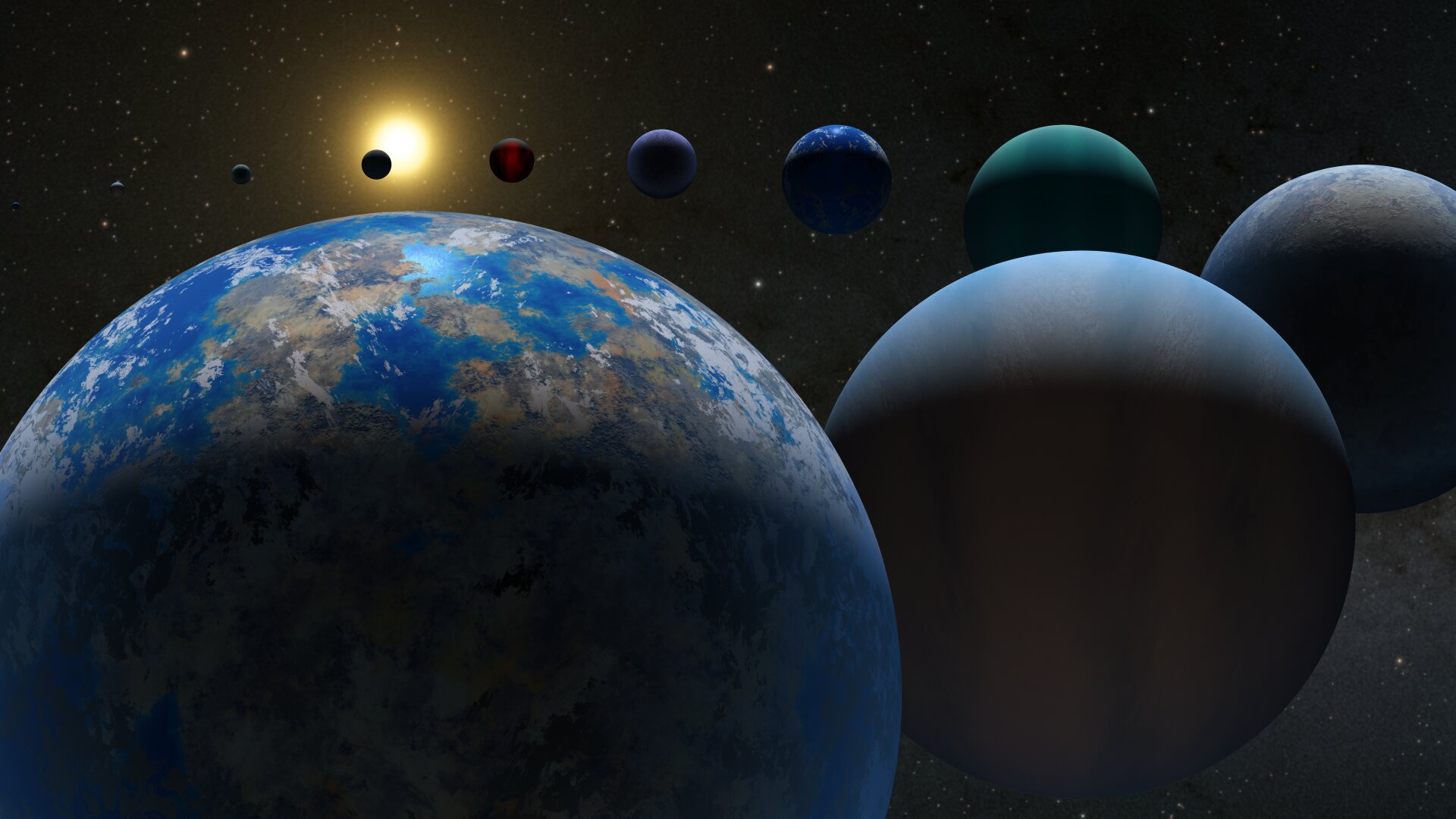
by 앤디 토마스윅Andy Tomaswick, Universe Today
모델들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부터 태초의 은하계 거대 구조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때로는 더 평범하지만 어쩌면 더 복잡한 특징들, 예를 들어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까지도 모델링한다.
국제 고고학 연구소International Archaeological Research Institute (IARC) 토마스 레퍼드Thomas Leppard와 그의 공동 저자들은 모두 고고학자이기도 한데, 인류가 초기 이주 과정에서 태평양 건너편 여러 섬으로 어떻게 확장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적용하여 인류가 우주 식민지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Acta Astronautica에 게재된 이 논문은 섬 고고학island archaeolog을 활용해 진행 중인 우주 식민지화space colonization 노력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덟 가지 교훈을 제시한다.
우주 식민지화를 위한 고려 사항은 단순히 다른 행성의 표면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자원 가용성, 유전적 요인, 그리고 문화적 유대감도 고려해야 한다.
저자들은 여덟 가지 교훈을 생리적 요인과 생물문화적 요인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분했다.
첫 번째 교훈은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놀랄 일은 아니다. 다른 섬의 식민지화는 원래 인구와 가까울 때 가장 성공적이다.
이는 필요할 때 지원군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인구가 원래 인구와 함께 "메타개체군metapopulation"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 준다.
우주 탐사에서도 크기는 중요하다.
두 번째 교훈은 천체가 클수록 식민지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자원은 더 풍부하고 일반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주 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천체의 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너무 큰 행성을 고르면 가스 행성이나 사람을 짓눌 수 있는 중력이 있는 어딘가에 가게 될 것이다.
어차피 식민지 개척지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세 번째 교훈은 근처에 다른 잠재적 식민지가 많이 있는 "군도 형태archipelagic configuration"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피 기회evacuation opportunities"를 제공하고, 더 큰 메타 개체군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한다.
이는 행성과 위성 표면에 있는 개별 식민지에도 적용되지만, 인공 우주 거주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첫 번째 범주의 마지막 교훈은 다시 자원과 관련이 있지만, 이 경우 자원의 존재보다는 분포에 대해 다룬다.
자원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심각한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식민지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성간 식민지interstellar colony처럼 식민지가 원래 개체군과 완전히 분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주 식민지 개척에 열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첫 번째 식민지의 최소 규모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제안된 추정치는 22명에서 5,000명까지 다양하지만, 논문에서는 최소 1,000명을 제시한다.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상적인 규모는 "기술적 생태적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큰 규모"다.
이는 심각한 근친 교배 없이 인구의 장기적인 유전적 생존력을 보장하고, 이상적으로는 인구 자체의 다양성을 허용하여 모든 식민지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 체계를 제공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원래 인구와 다른 식민지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여섯 번째 교훈이다.
표면적으로는 소규모 인구의 인구학적 완충 작용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자원 교환과 아이디어 교류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식민지가 멀어질수록 이러한 연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다른 별의 식민지 개척에 관해서는 적어도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최소한 그러한 경우에는 정보가 양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며, 출처 인구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유지할 수 있다.
일곱 번째 교훈은 조금은 직관에 어긋난다.
자원을 활용하고 자체 식민지의 안정적인 인구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 후, 성공적인 식민지는 계속해서 자체 식민지선colony ships을 보내야 한다.
이는 첫 번째 식민지가 "자원 한계resource ceiling"에 부딪힐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자체 인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생태계(그리고 많은 경우 물리적 시스템) 보존이 여덟 번째 교훈이다.
초기 우주 식민지화 대상에는 생태계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식민지의 물리적 시스템이 서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 부족은 식민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일련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적어도 초기에는 현상 유지를 시도하되, 처음부터 지구화에 착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이 모든 교훈을 염두에 두고, 이 논문은 특히 흥미로운 식민지화 후보 몇 곳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화성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만, 서로 가까이 위치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목성의 위성들이 두 번째로 유력하다고 말한다.
외계 행성의 경우,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GJ 1061이다. 약 12광년 떨어져 있어 비교적 가깝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나 그 근처에 세 개 행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로는 GJ 887과 바너드별Barnard's Star이 있는데, 바너드별은 GJ 887의 약 절반 거리에 있으며 네 개 행성을 거느리지만, 이 모든 행성은 수성과 너무 비슷해서 "바람직한" 식민지화 목적지가 될 수 없다.
이상하게도, 이 논문은 달이나 거대한 우주 거주지 함대의 식민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각 행성은 자체적인 작은 "섬"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유는 유용할 수 있지만, 우주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하늘에 우리만의 섬"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벽하지는 않다.
그건 우리가 지구에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우주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지 실제로 시도해 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More information: Thomas P. Leppard et al, How to successfully colonize space: Lessons from island archaeology, Acta Astronautica (2026). DOI: 10.1016/j.actaastro.2025.10.053
Journal information: Acta Astronautica
Provided by Universe Today
***
언뜻 황당하기 짝이 없게 보이는 저런 연구를 왜 고고학도들이 할까?
먹고살기 위해서다.
고고학도 우주 개척에 쓰임이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발악이다.
신대륙 개척에 나서는 고고학 저런 움직임 처절하지 않은가?
'NEWS & THESI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하와이 야생블루베리, 6,000㎞ 날아 일본에서 왔다 (0) | 2025.11.11 |
|---|---|
| 단순하게만 보이는 스페인 선사 도기들에 복잡한 사회 구조가 있다 (0) | 2025.11.11 |
| 간접 연대는 싫다, 공룡알껍질 직접 연대 측정 (0) | 2025.11.11 |
| 알파벳 발상지 우가리트 14년만에 발굴재개 (0) | 2025.11.10 |
| 잉카 제국의 비밀 구멍 띠가 마침내 미스터리를 풀다[Antiquity] (0) | 2025.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