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만이 연나라에서 도망쳐 그 무리와 함께 처음 숨어든 땅은
한나라가 지키는 요새 바깥은 공지空地였다.
그리고 이 공지는 고조선 땅도 아니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조선과 한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공지였다는 말이다.
고조선으로서는 공지에 사는 위만을 서쪽 변경을 지키는 박사로 임명했다니
고조선이 볼 때 그 땅은 공지가 아니라 자기들 땅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 땅은 비워둔 땅이었다.
관념상 누구의 땅이건 간에 일단 비운다는 말이다.
청나라 때 유조변柳條邊 바깥 땅도 관념상으로는 청나라 땅이었지만
자기네들 땅을 비워 공지로 만든 것이다.

DMZ가 오늘날 한국과 북한 사이에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겠다.
위만이 건너와 살았다는 한나라 요새 바깥의 공지는
아마도 청나라 때 유조변 바깥에서 압록강 북쪽에 설정된
공지와 거의 방불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공지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위만이 동래東來했을 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양국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흔히 고대국가 경계가 되는 지역에
유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것 같다.
이러한 것들도 모두 양국간 경계의 공지다.
관념상으로는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어 선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어떤 형식으로든 공지를 만들었다.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가 되는 평양 일대가
굳이 그 시대에 황무지로 남게 된 것은 양국간 공지를 그곳에 설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고려 초기에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개발한다는 것은
곧 북방국경 너머의 공지를 그보다 더 위로 올린다는 이야기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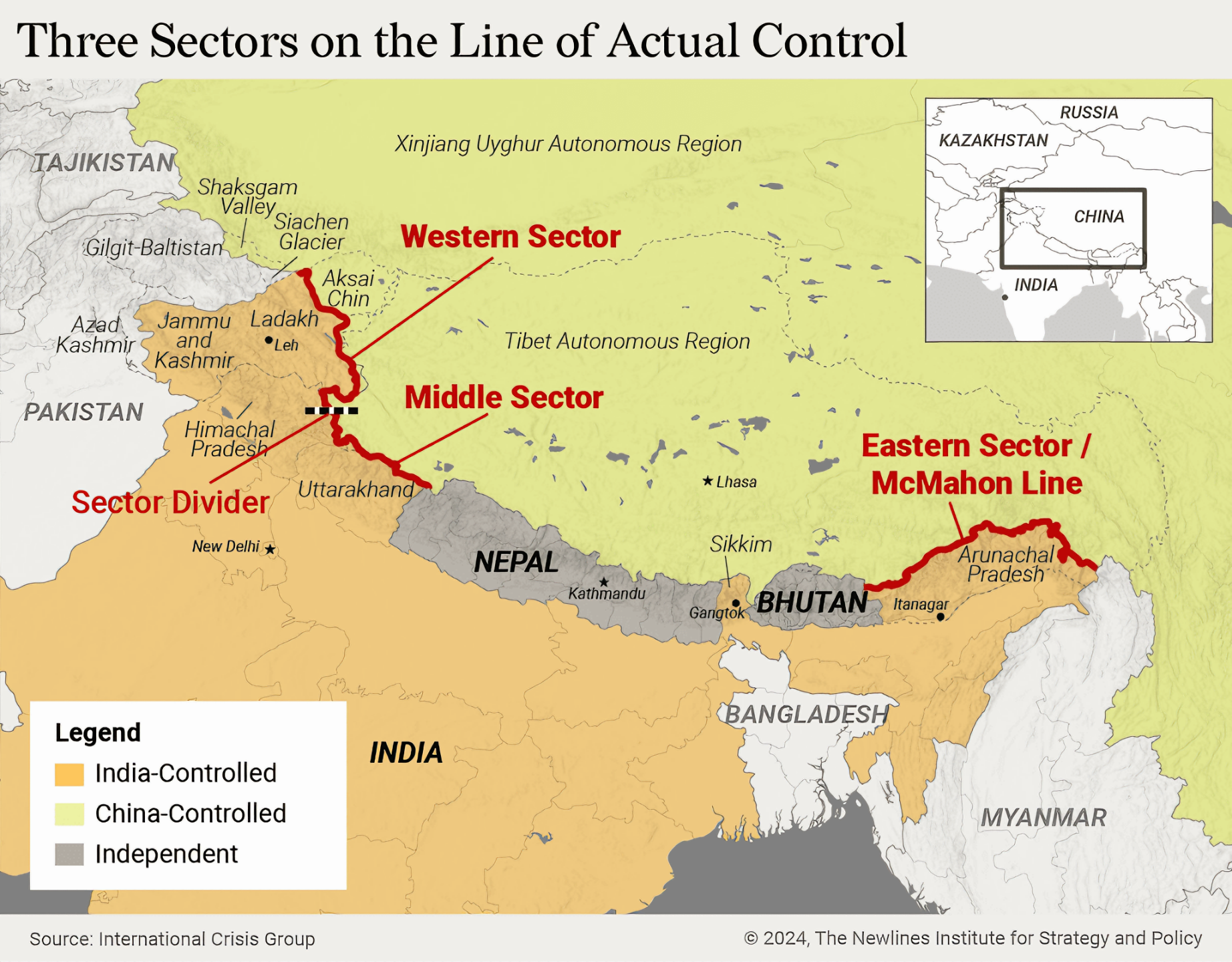
처음에는 평양 일대에 설정된 공지가
서경이 개발된 후에는 아마 더 북쪽으로 올라갔을 텐데
그곳이 바로 강동육주 일대가 아닐까.
이 국가간 경계가 되는, 빈 땅은
항상 월경자의 땅이 되었으며
순치되지 않은 종족의 활동무대가 되기도 했다.
이론상으로는 거란과 고려가 국경을 맞대어야 하는 강동육주에
여진이 나타난 것도 같은 이유이다.
공지는 역사상 실존한 땅으로서
양국이 실효지배한 땅 바깥의 독특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 지역을 현대국가의 눈으로 보아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으며
봉금封禁 지역으로 넘어들어간 18-19세기 조선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
이 버퍼존 buffer zone, 완충지대 문제는 꼭 국가간 국경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문화재 구역의 경우 지정 구역이 있고 그 배타하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지점 사이에는 버퍼존이 설정된다.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자를 잊는다는 것은 절연한다는 것 (1) | 2025.02.21 |
|---|---|
| 공지가 돌파되는 경우: 병자호란의 예 (2) | 2025.02.20 |
| 국경의 변화와 전염병 (0) | 2025.02.19 |
| 유조변이 만든 공지: 전염병의 장벽 (1) | 2025.02.17 |
| 갱지의 추억 (1) | 2025.0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