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니 제안서 심사니 하는 자리에 가끔 불려간다. 가는 나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떡하니 짜잔하고 나타나서는 책상에 놓인 커피 한 잔 바닥소리 날 때까지 빨대 빨며 블라블라 몇 마디 하고는 말로는 실로 그럴 듯한 의견서니 점수표 매겨 툭 던지고는 유유히 사라지지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날 며칠, 아니 몇 주를 고생했을 것이다.
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차려준 밥상에 이것저것 간보다가 나타날 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난 또 떠난다. 남은 사람들은 그 치닥거리를 또 할 것이로대, 그것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또 다른 업무의 시작 아니겠는가?
모든 세상사가 그렇지 않겠는가?
나는 저런 상차림을 별로 해 본 기억이 없다. 이 회사 몸담기 전 잠깐 적을 걸친 어느 공공기관에서 그런 비스무리한 일 하다가 금새 떠나버리고는 이내 이쪽에 기자라는 이름으로 정착했으니, 그 기자생활도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른바 관록이라 할 만한 것이 쌓이니, 저런 자리에 불려가기도 한다.
그러다가 어찌하여 이 공장에서 사업이라 할 만한 것도 아주 잠깐 했으니, 이때는 내가 밥상을 차리는 쪽이었으니, 나는 그 부서장으로 입만 나불락대며 이리해라 저리해라 했을 뿐, 실상 그 밥상 차리는 고된 일은 이른바 실무진으로 일컫는 친구들 몫이었다.
이때 나는 밥상을 차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할 사람 고르는 사람이었다.
전반으로 보아 내부에서는 이리저리 치었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바깥지점에서는 나는 편하게 산 셈이다.
그렇다 해서 젠 체 하지 않으려고는 한다고는 했지만, 사람에 따라 실로 거덜먹거리는 존재로 보였을 수도 있으니, 혹 그런 데서 아니꼬움을 느꼈을 분들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인간 만사 그렇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른바 실무진이라 일컫는 그 무수한 모세혈관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돌아가지 않겠는가?
기자들한테 물으면 한결같이 손사래치는 말이 있다. 기자들을 일컬어 이른바 권력 있는 사람이라 하면, 하나같이 개털이라고 부인한다. 나 역시 그러하다. 이는 겸양인가? 과장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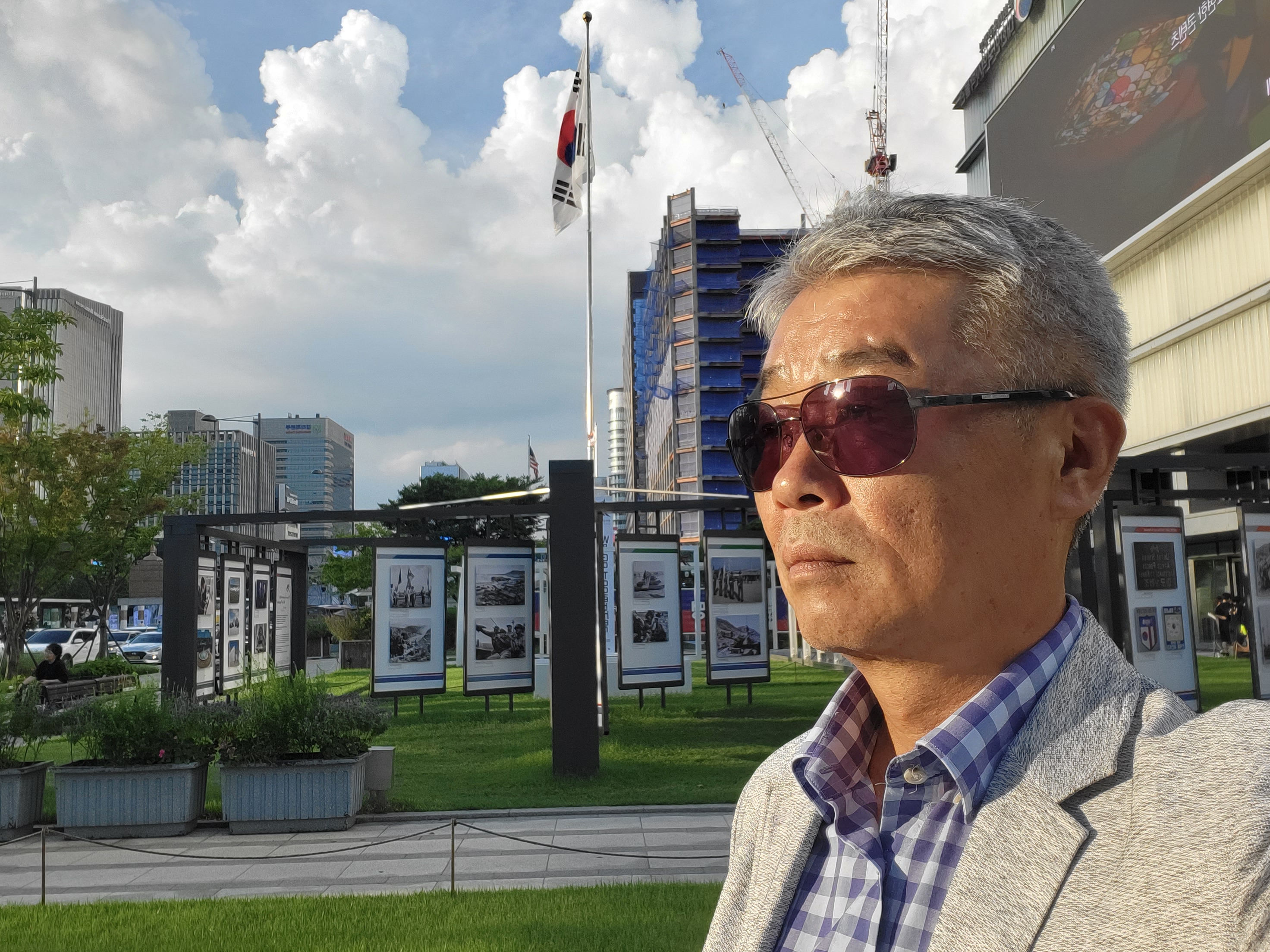
아니라는 데 아이러니가 있다. 물론 아주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느 기자도 자신이 권력 혹은 그 비슷한 자리에 있는 계층 혹은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못한다. 왜 그런가?
내가 가진 힘, 권력은 실로 쥐꼬리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니라고 극력 부인할 뿐이지, 겸양도, 과장도 아니다.
한데 또 내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또 다른 아이러니가 있다. 나 역시 매양 비난 혹은 비판 받는 대목이기는 하거니와, 이른바 세평世評이라 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기자한테는 물어서는 안 된다. 기자한테 물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다. 다 물으면 그 사람 괜찮다고 말한다.
나? 하도 까칠한 말들 쏟아내니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나 역시 분명히 저에 속하는 사람이라, 이른바 세평이 그 사람의 장단을 두루 지적하고, 업무력 등등을 종합으로 평가하는 분야라 한다면, 나 역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답하는 일이 100번 중 99번이다.
이런 나를 매양 콕콕 찌르며 이른바 팩트 폭격을 가하는 지인이 있는데, 날더러 늘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신은 기자가 어떤 자리를 몰라서 사람 볼 줄 모르는 거다. 우리 같은 공무원한테 기자는 어떤 존재인지 당신은 실감 못한다. 그래서 당신들 전화, 당신들 자료 요구에 다 친절히 응한다. 기자란 그런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엄청나게 크다. 그런 기자한테 누가 데면데면하게 대하고, 맞서겠는가? 당신한데 모든 사람이 좋아보이는 이유가 그것이다."
아! 오늘도 얘기가 옆길로 샜다. 이걸 이야기하려 함이 아니었는데 스핀오프로 가버렸다.
어제도 그런 비스무리한 자리가 있어, 그런 자리를 준비하는 이른바 실무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뭐랄까? 매번, 아니 매번이라고 하면 과장일 듯하고, 자주 혹은 더러 느끼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다.
나이 들어가선인지 요새 내가 부쩍 인생타령을 일삼고, 그 와중에 찢어진 가난을 한탄하고 분노하지만, 또 그런 나를 보는 몇몇 지인은 지금도 그러냐 이제는 벗어버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그래 객관으로 보아도 뭐가 됐건, 그 찢어진 가난을 안고산 엄마아부지 덕분에 나는 '불려가는' 자리에 왔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권력 맞다. 그런 나를 즐기기도 할 것이며, 그런 나에 만족할지도 모른다. 그래 솔까 나도 나를 갈수록 모르겠다 퉁쳐 둔다.
다만, 이른바 실무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더러 한다. 저들이라고 언제까지 저런 자리에서만 있어야 하나? 저들도 다른 자리에 불려갈지 모르지만, 저들이라고 왜 실무자로만 있어야 하나? 저들도 불려갈 수는 없는가?
물론 그리되면 불려가는 웃대가리만 남은 가분수 사회가 되겠지만, 그리하여 남은 실무자들은 더욱 치여드는 형국이 되겠지만, 그것을 또 자연하는 세대교체로 본다면야 저들도 언젠가는 불려가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
다만 세상은 비극이라, 한번 실무자는 영원히 실무자인 경우가 100명 중 99명이더라.
아니꼽다 생각하겠지만, 어디서 줏어온 싸구려 감상주의 동정주의라 하겠지만, 그래서 나는 내가 아낀다 생각하는 몇몇 젊은 친구한테는 언제나 묻곤 한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 만족하며 혹은 목구녕 포도청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하니? 너도 떵떵거리며 살고 싶지 않니? 너도 불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니? 기왕 주어진 인생 그래 진부하기는 하다만 폼나게 살다 가고 싶지 않니? 언제까지 나는 욕심없어요, 이걸로 만족해요 스스로 세뇌하며 살 거니?"
지나고 보니 저것도 다 소용없더라. 언제나 진리는 지 인생은 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떠밀어도 지가 용납을 하지 않겠는다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대로 살도록 내삐리 두는 것인데 괜한 분탕질만 한 것이 아닌가 후회하곤 한다.
셀라뷔
'ESSAYS & MISCELLAN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전략연구원으로 개편해야 한다 (0) | 2023.09.06 |
|---|---|
| 산업전과 학술대회는 다르다 (0) | 2023.09.06 |
| 돈을 못 벌게 하는 문화재 행정 구조부터 혁파해야 한다 (1) | 2023.09.05 |
| 영화 한편으로 1조원을 벌어들이는 오펜하이머, 그 기개가 문화재산업에 필요하다 (0) | 2023.09.05 |
| 관종을 응시하는 침묵하는 시선 (0) | 2023.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