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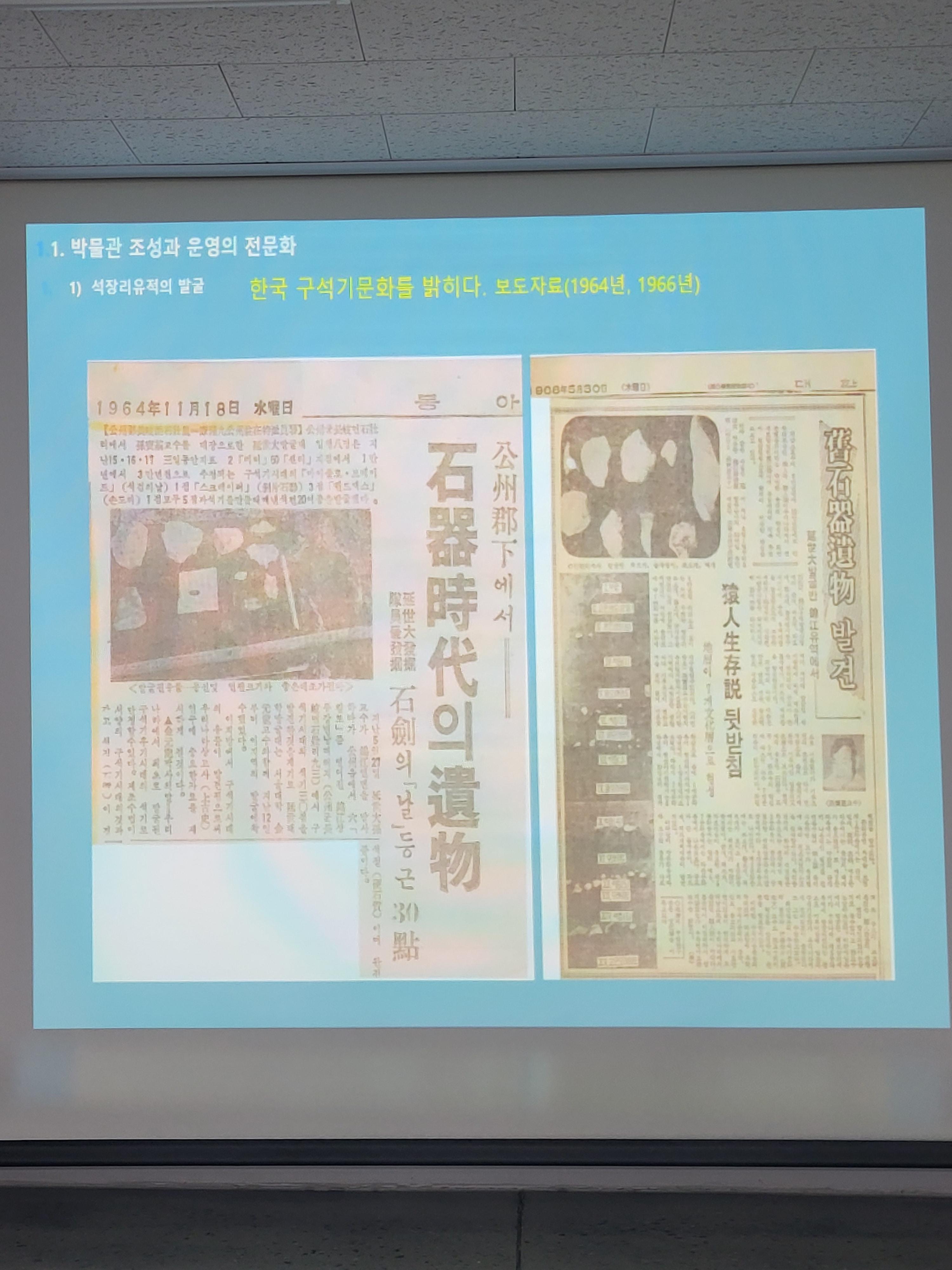
오늘 오후 오이도박물관에선 선사시대를 주제로 삼는 전국 공립박물관 관계자들이 그 현황을 점검하면서 우째 살아갈지를 모색하고자 하는 작은 모임이 있어 나는 그 자리에 이집트도 못 가 본 옛 토공 부장 출신 김모 충배 국립고궁박물관 전시과장과 더불어 두 토론자 중 한 명으로 초대되어 오후 반차를 내고 박물관으로 행차했거니와
발표 내내 갤갤 골골거리며 졸음과 싸웠으니 망할 주관회사 무슨 길인가 하는 곳 평사원 영디기가 하필 단상 맨 앞줄 중간에다 떡하니 기명 자리를 배정하는 바람에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다.

잠을 쫓느라 별의별짓을 했으니 지갑 뒤져 나온 천원짜리 석장을 자리에 놓고는 이리저리 사진까지 박았으니
내 아무리 이런 자리만 오면 골아 떨어지기는 하지만 오늘이 유별난 듯해 왜 그런지 돌이켜 보니 뿔싸 새벽 세시에 깨선 한 숨도 더는 부치지 못하고 반신욕까지 해제낀 여파 아녔겠는가 싶다.


수송동 공장 출근했다가 대강 대중교통 두들기니 오이도박물관까지 두 시간을 소요한다거니와
광화문서 버스 타곤 서울역 내려 사호선 끝장인 오이도까지 전동차를 이용했으니 정거장 숫자 보고는 턱하니 한숨만 나온다.

오이도역은 언제나 집앞을 관통하는 사호선 끝장이라 해서 구내방송으로나 들었지 내가 이걸 타고선 끝장을 볼지는 몰랐다.
내리니 역이 저 모양이라 아시바 온통 치고선 공사가 한창이라
예서 다시 택시 타고선 박물관으로 향하기 전, 마침 점심시간이라 뱃가죽이 허리로 가는지라 근처에서 요기나 할 만한 데를 찾으니


역 구내에 오뎅가게가 보이니 주인장 이르기를 한 모타리당 천원이라 몇개 먹을까 망설이다 대꼬챙이 두 개를 부여잡으니 각중에 그 옛날 오뎅 모노가타리가 기억 저편을 스멀스멀 기어오른다.
언제 다른 자리서 쓴 적이 있는데 나는 오뎅이라는 요물을 국민학교 오학년 혹은 육학년 무렵에 처음으로 구경만 했다.
이미 폐교한지 수십년이요 지금은 포도밭인지로 교정이 변한 가례국민학교 인근 마을 도로 낀 어떤 집 어떤 사람이 그때 저 오뎅이란 요물, 그땐 저 넙떼데형이 아니라 오로지 몽둥이형만 독패하던 오뎅을 어디선가 가져와 그걸 저리 물통에다 끓여 팔았는데 나는 그 진동하는 오뎅 냄새만 맡고는 단 한번도 그걸 먹어보지 못했으니
까닭이야 별게 있겠는가? 그거 하나 사먹을 돈이 없어서였다.
그 오뎅 점빵을 지날 때마다 그 시시쿰쿰한 냄새가 그리도 유혹일 줄 몰랐으니 열여섯살에 시작해 서른넷 결혼까지 물경 18년을 계속한 자취생활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유혹이 갈치굽는 냄새였으니
그 갈치냄새에 휘말려서는 이젠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으니 그 갈치냄새와 더불어 오뎅 냄새는 내 인내를 시험했다.
그 시절엔 저 오뎅 배 터져 죽을 때까지 실컷 먹어보는 게 꿈이었다.
그때가 억울해서라도 오늘 배 터지게 오뎅 먹어볼 걸 그랬다.
만지작거린 저 천원짜리 석장은 두 개 뽀갠 오뎅이 거슬러준 오천원짜리 잔돈이었다.
'ESSAYS & MISCELLAN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화재 사진 찍다 마마무 화사 찾아나선 펜대 기자 (0) | 2021.11.25 |
|---|---|
| BTS한테 꼴랑 하나, 것도 후보로 던진 그래미 어워즈, ARMY라는 빛과 그림자 (0) | 2021.11.24 |
| 생물다양성 보고라는 갯벌엔 삭풍만 (1) | 2021.11.22 |
| 겁많은 놈일수록 칭칭 동여매기 마련, 일본 무사의 경우 (0) | 2021.11.22 |
| 퇴출해야 하는 언론과 뉴스포털, 차은우의 경우 (0) | 2021.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