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크레딧을 적다보면 지나간 일들이 스쳐간다.
‘아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지.’
혹은 이런 마음으로 약간은 예민해진다.
‘혹시 빠진 분들은 없겠지.’
전시는 오픈하고 나면 별 것 아니지만,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력이 들어간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한 도움부터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큰 일이 났었을 도움까지, 전시 막바지에는 그 도움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그래서인지 마치 학위논문을 다 쓰고 나서 감사의 글에 교수님, 부모님, 동기들, 자료를 제공해 준 곳 등등을 다 적은 것처럼, 크레딧을 적을 때도 모두의 이름을 감사의 마음으로 적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마음도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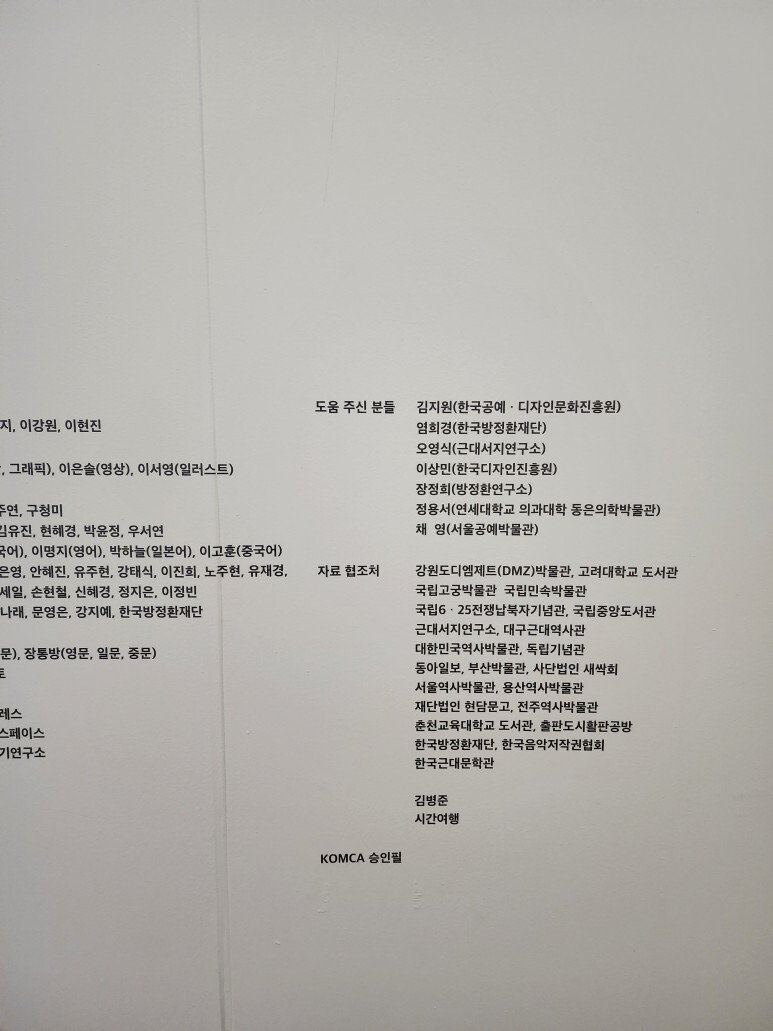
결정의 시간
전시 한 달 전, 전시장 풍경은 정말이지 정신이 없다. 관람객들은 모든 것이 다 세팅되고 난 정돈된 모습을 보지만,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 한달 전의 풍경은 공사판이나 다름없다.
벽체를 세우면서 먼지가 날리고, 페인트를 바르고 그래픽을 붙이고. 이때 학예사는 이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과 전시실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한다.
페인트도 내가 선택한 색이 제대로 나오나 하며 체크한다. 조명에 따라 색이 달라지기도 하니까 마지막 체크는 필수다.
하나를 결정하고 이제 좀 글을 수정해야지 하면, 또 다시 전화가 온다.
“이것 좀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전시실로 내려간다. 전시 한 달 전은 이런 일들의 반복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결정의 시간’이다.
다툼의 시간이기도 한 때
한편으로는 이 시간은 ‘다툼의 시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전시는 나 혼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네임텍이나 패널 위치 같은 사소한 결정이야 학예사가 하면 되겠지만, 그 외의 것들은 상사와도, 어떤 것은 관장님의 컨펌도 받아야 한다. 학예사도 회사원이니까 말이다.
처음에 전시했을 때는 어쩌다가 전시를 맡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사에게 검토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도 언젠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런데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기관이 클수록 결정하시는 윗분도 많아진다. 기관이 작아도 당연히 윗분들 의견은 물어봐야 한다.
돌이켜 보면 첫 전시를 할 때가 그나마 내 마음대로 한 때였다.
아이러니하게 그때가 내가 일한 곳 중 가장 큰 곳이었는데 나의 사수님과 부장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여태 내가 전시한 와중 가장 내 마음대로한 전시였다. 그때는 몰랐을 뿐.
어쨌든 윗분들 의견을 여쭈어봤을 때 당연히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
웬만하면 상사도 전시 기획자 의견을 최대한 맞춰 주려 하지만, 가끔은 결정적인 것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니만큼, 나도 상사 의견에 따라 가려 하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럴 때면 나의 생각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사(!)와도 가끔은(?!) 언쟁하기도 한다.
하지만 늘 집에 와서는 후회한다. 또 다른 J는 내게 그럴 거면 그냥 상사 말을 따르라고 조언했다. 흑흑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툼의 시간’에는 업체와 언쟁이 종종(!) 벌어진다. 시간과 예산의 한계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건 이런 재질로 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거나, 혹은 이 요소를 더 넣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된다거나 등등. 서로 밀당을 해야 할 일은 계속 벌어진다.
어떤 때는 서글픈 느낌이 들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진상 학예사인가.’ 싶은 생각에 반성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 모든 것은 전시 오픈 직전에 사르르 사라진다.
나에게 전시 크레딧이란
오픈 직전 쓰는 전시 크레딧에는 그래서인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마음이 담겨 있다.
유물 대여처 같이 감정이 섞이지 않은 곳들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다 내가 폐를 끼치거나 ‘다툼의 시간’을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크레딧은 내게 일종의 반성문 같은 느낌이다. 다음에는 진상 학예사가 되지 말아야지 하며 다짐하며 크레딧을 적는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덧 : 그런데 박물관의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대로 다 하진 못할 듯.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관장님이나 과장님도 내 전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두실 때가 있으실 것이니! 다 업보입니다 ㅋ
'J의 특별하지 않은 박물관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박물관이 직장인 사람이 마음 속에 모아두는 즐거움 (0) | 2023.08.05 |
|---|---|
|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 구술 인터뷰 (1) | 2023.07.22 |
| 학예사의 업무용 글쓰기 : 전시에서의 글쓰기란 (0) | 2023.07.09 |
| 전시 스토리 :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까 (2) | 2023.07.01 |
| [전시가 만든 인연] (2) 옷소매 붉은 끝동 덕임과의 만남 (2) | 2023.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