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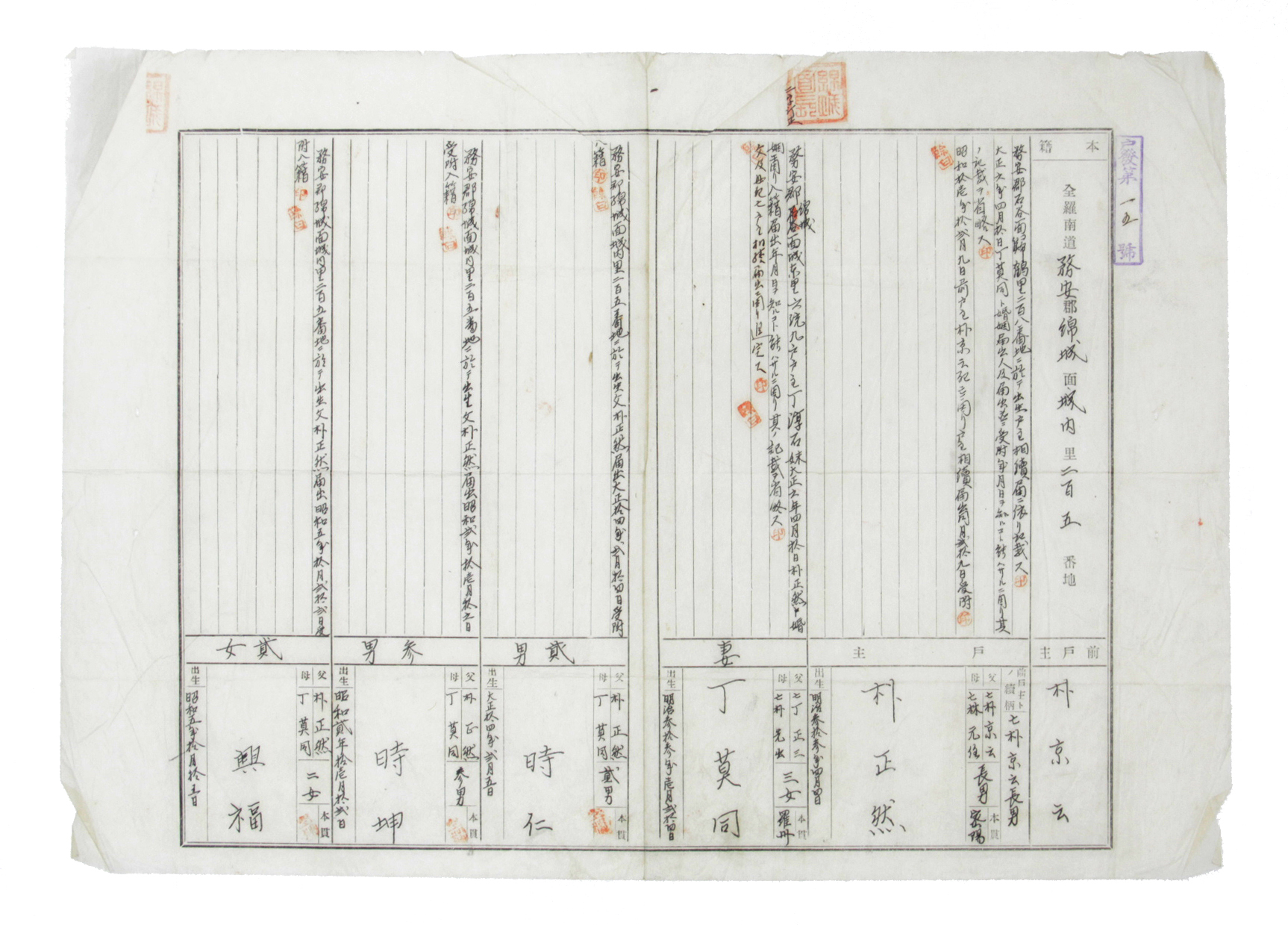
우리나라 삼남 지역 어느 고을의 1700년대 호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다.
앞에도 썼지만 가가호호
4-6명 정도 노비는 다 데리고 있었고
자작농은 거의 없어 보였다.
실제로 17세기 초반 상황을 그린 쇄미록을 보면
주인인 양반집이 각지에 흩어진 노비들로 부터 신공을 거두는 모습이 보이는데
또 다른 비슷한 시기 일기에서도 유사한 정경을 묘사한 것을 보면
17세기 초반은 지주 전호제가 성립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며
과연 이러한 노비 노역을 근거로 한 생산방식이 언제나 해소되는가를 궁금해 하던 필자로선
우리나라 삼남지역 번듯한 동네에서 1700년대, 즉 18세기 초기까지도
집집마다 4-6명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시기까지도 우리나라는 노비의 노역이 나라의 생산양식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말이다.
17세기부터 지주전호제가 확립되어
이 시기에 이미 광작운동이 일어나고
농민들 사이의 분화가 활발해져 자본가적 차지농이 나온다고 한
광작운동은 도대체 무슨 허깨비를 보고 입론한 것인가?
상품 화폐경제, 자본주의 맹아는 고사하고
18세기 초반까지도 집집마다 4-6명 노비를 거느리고 농사를 짓던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말이다.

반응형
'족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선왕조실록의 공노비 해방 교서 (3) | 2025.07.06 |
|---|---|
| 우리나라 지주전호제 (2) | 2025.07.05 |
| 김홍도 그림의 농민(?) 들 (0) | 2025.07.05 |
| 1700년대까지도 노비가 생산의 기초 (0) | 2025.07.04 |
| 민농시 쓴 여가에 노비 잡으러 다니던 양반들 (0) | 2025.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