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회사는 미사가 아니다.
교회사가 개인과 교단의 신심을 확인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논리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나.
한국의 성리학자들이 왜 18-19세기 엄중한 시기에
굳게 믿어오던 유교적 신념을 버리고 기독교를 택했는가,
그 사상적 동향,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가장 지금까지 방해해 온 것은
역설적으로 교단이 중심이 되어 수행한 교회사다.
필자의 앞 글, 초기 천주교회는 개신교를 더 닮았다는 이야기,
아마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대개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전혀 몰랐을 수 있는가?
물론 이러한 관점이 백프로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시각의 이야기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한국 초기 교회사는 특정교단의 역사가 될 수는 없으며
조선후기 사상사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회사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편집자주] ***
저 분야 연구는 필자 말마따나 거의 교계가 연구를 주도했으며, 그 연구자는 거의 예외없이 신앙심 독실한 기독교도들이었다.
신앙으로서의 역사를 한 셈이다.
이 점이 여타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 신봉자가 많이 달라든 불교의 그것과는 다르다.
학문이 신앙이 되면 주객이 전도된다.
물론 저 분야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앙이 아니라 학문으로 했다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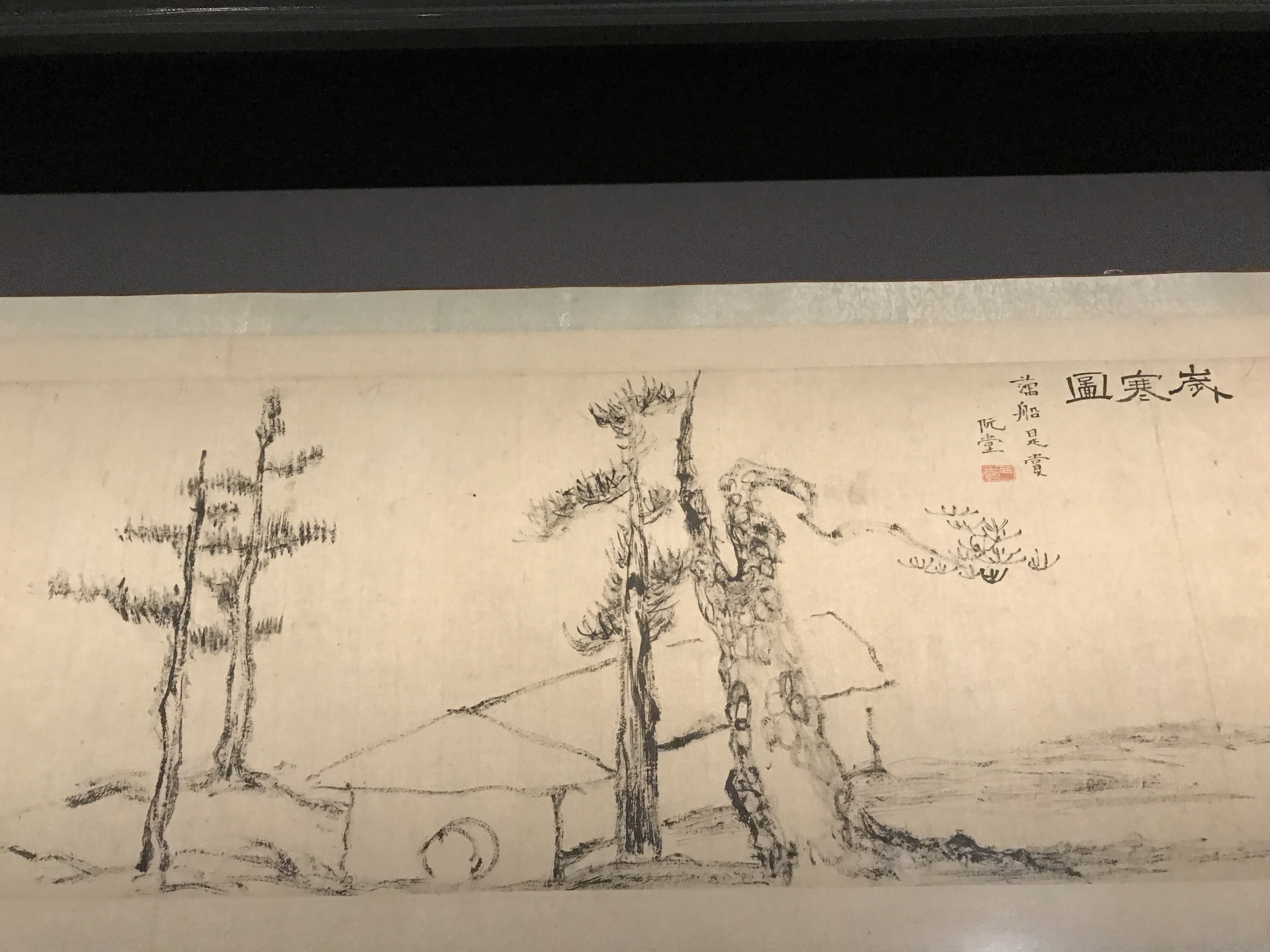
반응형
'사람, 질병, 그리고 역사 > 노년의 연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시작 (0) | 2025.05.08 |
|---|---|
| 최근의 중국 연구 수준 (0) | 2025.05.03 |
| 논문 검색의 회고 (4): 온라인에 둥지를 튼 저널들 (1) | 2025.04.27 |
| 논문 검색의 회고 (3): 혁명아 앨 고어 (7) | 2025.04.27 |
| 논문 검색의 회고 (2): MEDLINE (1) | 2025.04.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