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서 입거인을 만나다〔路逢入居人〕
성현成俔(1439 ~1504), 《허백당집虛白堂集》 제14권 시詩
못 보았는가 영호남은 사람 넘쳐나 / 君不見湖嶺人稠車接轂
천만 채 집 즐비하게 들어선 모습을 / 比櫛魚鱗千萬屋
또 못 보았는가 오랑캐 접한 국경엔 / 又不見龍荒朔野狄爲隣
초목만 우거지고 사람 하나 없던 모습을 / 灌莽滿目空無人
동남쪽은 꽉 차고 서북쪽은 텅텅 비어 / 東南富實西北虛
사람 모아 변방 채우는 일 늦출 수 없었네 / 募民徙塞不可徐
소 몰고 말 타고 어린아이 둘러업고 / 驅牛乘馬聯襁褓
고을에선 밥 대며 길 떠나게 재촉했지 / 州縣傳餐催上道
간장 찢어질 듯 소리 죽여 흐느끼니 / 呑聲暗泣肝腸裂
이웃 사람 듣고서는 같이 오열했지 / 隣里聞之共嗚咽
천리길 고생하며 황벽한 들에 와서 / 間關千里到窮郊
띠풀이 이엉 베어 울 엮고 집 지어 / 編籬作室誅蓬茅
쉼없이 부지런히 갖은 힘 쥐어 짜 / 勤勞力役於其中
삼년간 밭 일구며 농사 전력했지 / 三春畚鍤明農功
지난날 갖은 고생 지금은 기쁨이고 / 昔之愁苦今懽康
자루 담던 식량 창고는 가득하네 / 昔之囊橐今囷倉
따순 옷 배 부른 양식 갖췄는데 / 所須煖衣與飽食
어찌 동서남북 떠돌 일 있겠는가 / 安用東西與南北
입거인入居人 : 조선 초기 국경 지역에 이주하여 살도록 한 백성을 가리킨다. 세종 때 새로 개척한 4군郡과 6진鎭에 하삼도下三道 백성들을 이주시켰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상은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에 의한다.
못 보았는가 영호남은 사람 넘쳐나 / 천만 채 집 즐비하게 들어선 모습을 // 또 못 보았는가 오랑캐 접한 국경엔 / 초목만 우거지고 사람 하나 없던 모습을 // 동남쪽은 꽉 차고 서북쪽은 텅텅 비어 / 사람 모아 변방 채우는 일 늦출 수 없었네 //
이 초반 네 구는 영호남과 북방의 인구 대비다. 남쪽엔 사람이 너무 많아 탈이고, 북쪽엔 너무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서 넘쳐나는 남방 백성을 텅빈 북쪽으로 사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어찌 해야겠는가? 옮겨야지 않겠는가? 그 다음 아래 네 구가 강제 사민을 묘사한다.
동남쪽은 꽉 차고 서북쪽은 텅텅 비어 / 사람 모아 변방 채우는 일 늦출 수 없었네 // 소 몰고 말 타고 어린아이 둘러업고 / 고을에선 밥 대며 길 떠나게 재촉했지 // 간장 찢어질 듯 소리 죽여 흐느끼니 / 이웃 사람 듣고서는 같이 오열했지 //
사민은 강제할당이었다. 가장 먼저 지원자를 모았겠지만, 이럴 때 내가 가겠다 나서겠다는 사람 없다. 그래서 관아에서 강제 할당한다. 가장 먼저 선발 대상이 된 친구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죄수!!! 이들은 언제나 이럴 때 총대를 매야 한다. 죄 지은 사람들로 복역자가 가장 먼저 강제로 할당되어 떠났다.
자 떠났으니 이젠 정착해야 한다. 성현은 그 정경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천리길 고생하며 황벽한 들에 와서 / 띠풀이 이엉 베어 울 엮고 집 지어 // 쉼없이 부지런히 갖은 힘 쥐어 짜 / 삼년간 밭 일구며 농사 전력했지 //
이 대목에서 비로소 성현은 철저한 어용 시인 모습을 보인다. 떠남은 비자발이고 강제였지만 정착해서 스스로 바지런히 움직여서 농사도 잘 짓고 집도 잘 지었단다. 그렇게 3년을 투자하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단다.
지난날 갖은 고생 지금은 기쁨이고 / 자루 담던 식량 창고는 가득하네 // 따순 옷 배 부른 양식 갖췄는데 / 어찌 동서남북 떠돌 일 있겠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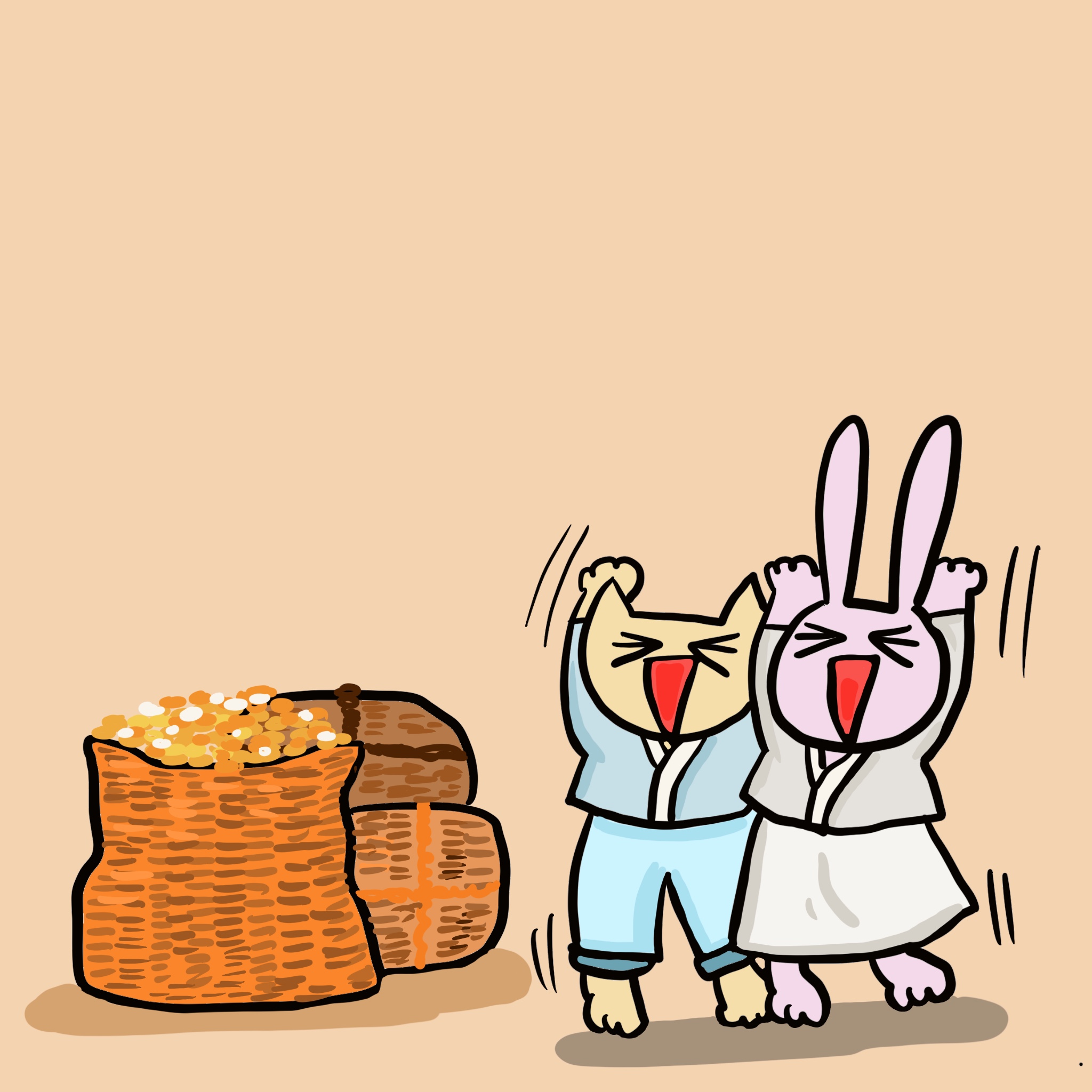
이 노래가 왜 살아남았는가? 바로 이런 어용성에서 비롯한다. 이게 다 백성 스스로가 부지런하고 국가가 왕실이 조정이 잘해서라고 찬탄한다.
하긴 사민이 순전히 고통뿐이었다고 노래했다면, 성현이 목숨을 부지했겠는가?
철저한 어용시다.
고전번역원 설명에 의하면 이 시는 성현이 성종 19년(1488) 사은사로 중국에 다녀오는 길에 평안도 지역으로 이주해서 정착한 백성들을 만났을 때 지었다고 한다. 조정 정책에 따라 눈물 흘리며 정든 고향을 떠난 남쪽 지역 백성들은 낯설고 황량한 변방 땅에서 집을 짓고 농토를 개척하느라 온갖 고생을 해야 했다. 이 시는 그런 고통을 노래한다.
고 하지만, 무책임한 풀이 혹은 이해다.
그럼에도 저 증언은 조선 전기 북방 개척에 따른 강제 사민을 직접 소재로 채취해 그들을 직접 보고 말을 나눈 사람이 남긴 증언이라는 점에서 대서특필해야 한다.
더구나 성현은 아마도 저 시를 짖기 전에는(내 기억에 의존하는 까닭에 후일 수도 있다) 평안도관찰사를 역임했으니 말이다.
'역사문화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llaboutEgypt] 성가족의 이집트 방문(2)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0) | 2023.01.09 |
|---|---|
| [AllaboutEgypt] 성가족의 이집트 방문(1) 콥트 정교회의 성탄절 (0) | 2023.01.07 |
| 18세기 탑골공원의 '폭소클럽' 백탑파白塔派 (0) | 2023.01.03 |
| 영조의 죽음, 왕은 자주 죽어야 혼란이 덜하다 (0) | 2023.01.03 |
| [유성환의 AllaboutEgypt] 이집트어로 이 단어는?(24) 이집트 토끼 - 레푸스 아이귑티아카 (0) | 2023.01.02 |




댓글